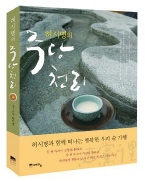
허시명, <허시명의 주당천리>, 예담, 2007
한겨레21이었는지 행복이가득한집이었는지 쿠켄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잡지에서 신간소개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신청해 보게 된 책입니다. 책이 두껍고-종이가 두껍습니다. 거기에 컬러사진.-좋은 종이를 써서 그런지 책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무거움에도 신경쓰지 않고 들고 다니며 보게 된 책, 다른 분들께도 꼭 한 번 읽어보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독자는 이렇습니다.
- 나는 맛있는 술이 좋다.
- 일본에는 사케가 있는데 왜 한국에는 없는거지?
- 술, 술, 술이 고프다.
여기까지는 보통수준. 심화로 들어가면..
- 난 모야시몬을 재미있게 봤다.'ㅂ'
- 일본에는 사케가 있는데 왜 한국에는 없는거지?
- 술, 술, 술이 고프다.
여기까지는 보통수준. 심화로 들어가면..
- 난 모야시몬을 재미있게 봤다.'ㅂ'
실은 저 네 번째가 가장 큽니다. 보는 내내 옆에서 오리제가 둥둥 떠다니며 "빚어버릴거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민속주, 한국 술에 대한 이야기. 지방의 술도가에서 빚어내는, 역사가 있는 술과 역사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술, 그리고 발전하는 한국 술, 사라진 한국 술, 법제에 가로 막힌 술에 대한 이야기가 술술 풀려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누룩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고, 당연히 누룩이 등장할 때마다 오리제가 둥둥 떠다닙니다. 오리제가 일본산이라는 것만 빼면 뭐... 납득할만 합니다.
대신 이 책의 부작용은 좀 심각합니다.
전 술을 안마십니다. 사정을 알고 있는 소수를 제외하면 다들, 저 술 못마시는 줄 압니다.'ㅂ' 대학교 때 술에 크게 당한 이후로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고 사회들어와서는 2년마다 받아야했던 위내시경의 결과를 슬쩍 흘리면 술을 강하게 권하지는 않으시는군요.
술을 안마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맛을 모릅니다. 특히 소주는 그 쓰고 칼칼(?)한 맛이 싫어서, 화학약품을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싫어서 마시지 않습니다. 그나마 마시는 것은 맥주 정도입니다. 맥주는 흑맥주와 가벼운 맥주(에비스 등의 일본맥주), 한국 맥주의 차이 정도는 감별하는데다 가끔 여름날 시원한 맥주가 땡기는 일도 있으니 이쪽은 마시는 술입니다. 포도주는 마시긴 하지만 있으면 마시지 즐기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포도주는 무스카토 다스티의 스파클링 와인. 마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왠지 사과주 느낌입니다.; 달달하고 사이다 같기도 한 발포성의 음료입니다. 술이라기보다는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하여간 본론으로 돌아가 부작용이 뭔가 하면 .....
술이 땡깁니다.;ㅂ;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술이 땡깁니다. 책이 줄어드는 것이 아까워서 일부러 조금씩 아껴가며 보고 있었는데 마침 지난주에 G가 제주도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제주도에서 만들었다는 감귤술을 보고 이게 분명 면세점 안에도 있을터이니 사오라 시킬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지름도 80%. 100%가 되면 구입합니다.-_-;) 다행히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경주법주인 화랑을 Kiril님께 졸라서 올 구정에 부탁드려볼까라는 망상의 나래도 펼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제가 이 책을 보는 내내 등장하는 모든 술에 군침을 흘리며 한 번쯤 마셔보고 싶다고, 기회가 되면 꼭 구해서 마셔보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책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절반 이상의 이유는 글발일겁니다. 맛깔나게, 술술 넘어가는 글을 쓰니 술도 술술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착각이겠지요. 아직 술맛도 제대로 모르는 제가 술이 술술 넘어갈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목에도 쓴 주당1천양병설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한국술-민속주-들을 살리기 위해 술꾼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한다는 제 주장입니다. 희석식 소주가 아닌 증류식 소주나 탁주 등 다양한 술을 알고 그 맛을 즐기는 술꾼들을 양성해 술 시장을 넓히며, 이런 술꾼들이 늘어나면 술을 만드는 술꾼들 역시 살맛이 나서 옛 기록들을 뒤지고 술을 빚을 줄 아는 옛 아낙들을 찾아 전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옛술들이 복원되면 잊혀진 전통에 대한 관심들도 늘어나고....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 이상 나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모르니까요.
하여간 알코올을 섭취하기 위해 술을 퍼붓는 술꾼이 아니라, 술맛을 알고 술을 즐기는 술꾼들을 길러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술도 음식이니 한국음식을 가르칠 때 술도 함께 가르쳐 酒道를 미리미리 가르쳐야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딘가 찾아보면 한국주 코스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법한데 본 적이 없군요. 시간이 더 지나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하여 이 책을 읽고 나서 마흔 되기 전의 목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와인은 저 멀리 던져 놓고 일단 우리나라의 옛술부터 찾아가 하나하나 맛을 알고 술맛을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이 책은 고이 모셔두고 두고두고 목표를 일깨우기 위해 읽을 생각입니다. 아아.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군요.(...)